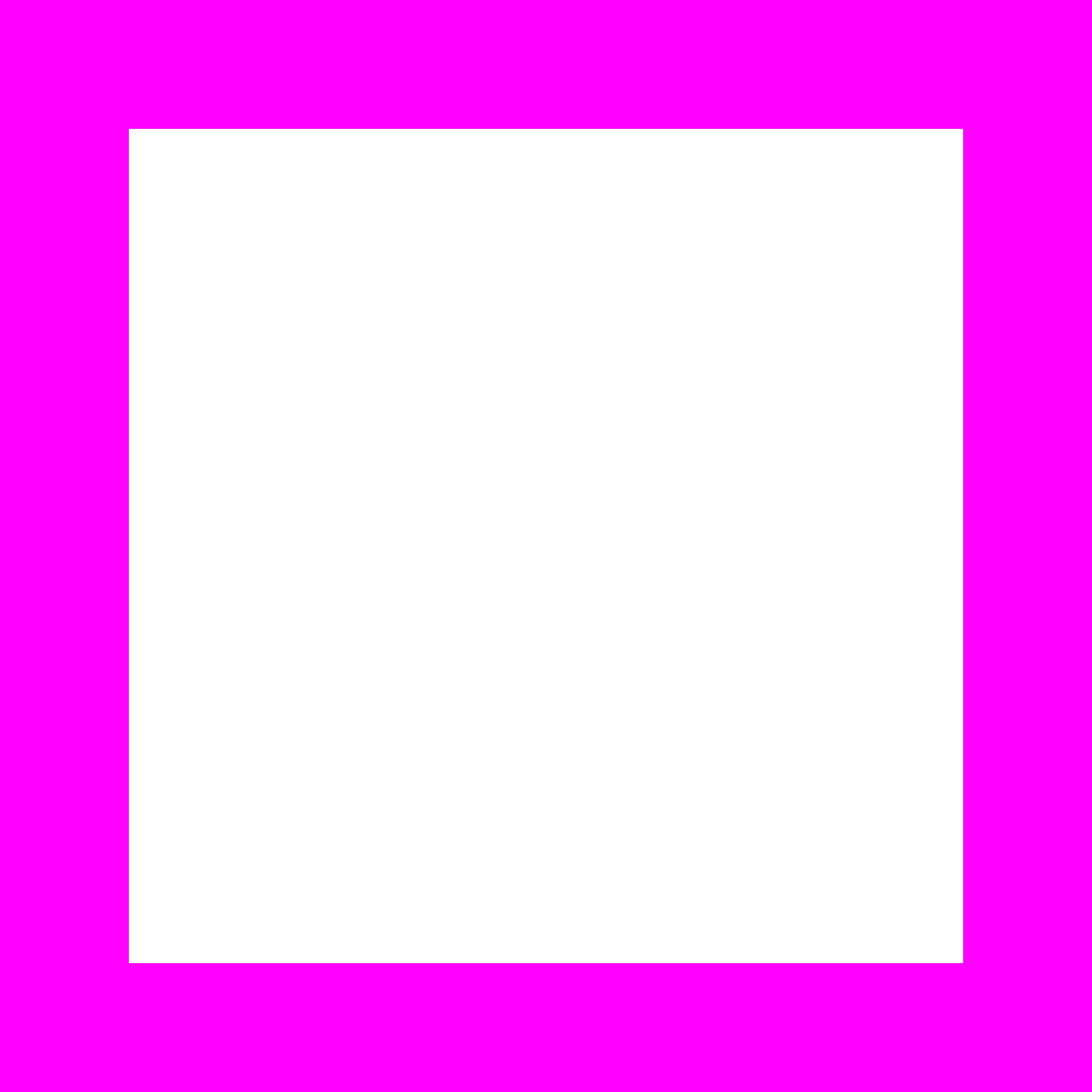Lava Lamp
March 15, 2021 - April 24, 2021
@Spectrum Gallery
As the third edit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series, Spectrum Gallery is delighted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of Seoul and Philadelphia-based artist Min Baek. The exhibition entitled is scheduled from 16th March to 10th April 2021. The title coins the term of an incandescent glass object. Within its transparent interior, the colored liquid mixture moves upwards and downwards repetitively, stimulated by constant heating and cooling. Such chemical reactions of a lava lamp share Min Baek’s idea centered around the human body in an abstract territory. The execution of heterogeneous materials and multilayered structures in Baek's paintings conveys the bodily phenomenons and the chemical reactions within a lava lamp. The works are a result of an accumulation of coincidental variables: spraying, pressing, spilling, and glazing on every layer of the paintings. By realizing the mobile and unpredictable nature of the body, Min Baek’s works present “an image not for the present, but the next”.
March 15, 2021 - April 24, 2021
@Spectrum Gallery
As the third edit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series, Spectrum Gallery is delighted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of Seoul and Philadelphia-based artist Min Baek. The exhibition entitled
⭢ Interview with Seojin Yim
민백 작가 인터뷰
질문: 임서진(미술비평) / 답변: 민백
1 - 라바 램프와 몸이라는 공간
2 - 제도 무렵의 미술, 재현, 그리고 환상
3 - 추상의 방언을 변주하기
라바 램프와 몸이라는 공간
임서진(이하 임): ‘라바 램프’와 ‘몸’이 전시의 키워드로 소개된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회화적 표현, 라바 램프, 그리 고 몸에 대한 생각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었는지 궁금하다.
민백(이하 민): 그림이 먼저 있었고, 그 그림을 “Lava Lamp 01”이라고 제목 지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몸’과 연 결 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바 램프라는 오브제는 오래전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라바와 램프의 조 합이 너무 이상했다. 시각적으로 유혹적이고 색이 강렬한 오브제 같았고 라바 램프의 공간이 내가 만들고 싶어 하 는 공간의 느낌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 이후 비슷한 태도로 그린 것들을 모두
“Lava Lamp”라고 제목 지었다. 여기서 비슷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종착점에 대한 가정이 없었던 것, 시간을 두고 가볍게(투명하게) 중첩하고자 한 구성, 그리고 이질적 성격의 파편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라는 조건들을 의미한 다. 지금 언급한 몇 개의 구심점을 제외하고는 아무 제약 없이 그리는 게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의 목표였다. 사실 추상 작업은 제목을 짓기가 어렵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제목에서 너무 많은 단서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목이 지나치게 설명적이어도 안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토대를 가리키는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이 정보 자 체가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라바 램프가 작품에 대해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였다. 이번 전시 가 라바 램프 연작으로 구성되었지만 하나의 통일된 미감이나 스타일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보다는 개별 적인 그림에 맞는 개별적인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다.
임: <Lava Lamp 01>(2019)에 적용된 태도가 그림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나?
민: <Lava Lamp 01>은 2019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쯤, 나의 언어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만든 작품 이다. 이번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작업이 많이 변했다. 이전에는 상징이나 기호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형상, 일종의 지시적 언어 같은 것들을 간단한 회화적 트위스트와 함께 그렸다. 예를 들어 엑스 모양 의 선을 그리고 그 선에 파란색 모양을 넣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미있는 트위스트들로 화면을 구성했다.
전시작들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그림 톤이 조금 더 미묘하고 납작했던 것 같고, 단색으로 칠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얻고 싶은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색깔 채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그저 수단이 되는 것 같았다. 그걸 더는 하고 싶지 않았고 과정 중에 내가 조금 더 깨어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는 내가 그린 그림보다는 그려진 그림, 스스로 자생하 는 혹은 자라나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었다. 그 방법을 고민했고 결과물을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과정을 더 포용해야겠다는 것이 처음 떠올린 방법이었다. 그리기에 수반되는 모든 결정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무시되지 1 않고, 착취되지 않는 방법을 고심했다. 마지막에는 그 과정들이 모두 잘 얽혀서 저절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그림
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Lava Lamp 01>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설정한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제한점보다는 중심점을 바꿨던 것 같은데 일단 형상을 그리지 않는 것과 그림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었다. 이전 작업에서 항상 도 형과 윤곽을 사용했고 주로 작은 스케일의 작업을 했었는데, 과정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기
1 “과정을 포용한다”라는 말에서 “포용(embrace)”은 그리기의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수행, 이용, 활용, 사용, 받아들임 등의 표현으로 대체했을 시 원래의 중의적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생각되어 본문에 서는 일괄적으로 “포용”을 사용하였다.
1
로 했다. 스케일의 경우 작은 스케일이 보는 사람을 집중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서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작업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스케일이 커졌을 때 내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계 속 벌어질 것이고 그걸 이용해보자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Lava Lamp 01>은 나의 움직임, 흔적, 얼룩 등의 요 소로 만들어졌다. 작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캔버스 위에 어떤 흔적이나 색을 캔버스에 올린다. 이 첫 단계의 표 시가 가진 고유한 느낌이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느낌의 표현을 옆에 넣는다. 예를 들어 조금 눌린 모양이 첫 단계 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옆에는 튀어나오는 걸 그려 넣는다. 호환되는 것 혹은 반대되는 것을 병치하고, 이질적인 그 것들을 한번 묶어주고, 또다시 그것들을 흐트러트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한다. 그렇게 과정 중에 내 주관에 따른 시각적 상호작용, 반작용, 연쇄작용이 있었다.
임: “몸(공간)”이라는 용어에 대한 민백 작가의 정의가 궁금하다.
민: 다양한 것들이 혼재하면서 자생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이라는 이 가상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촉각적 형태를 상상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게 물질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간을 떠올려야 했고, 촉각적 형태로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내게는 몸이라는 공간이었다. 나와는 독립된 별개의 오브제 인 라바 램프에서 내가 가진 몸으로 생각을 옮겨왔다. 어떻게 보면 몸은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 작한 전환점이 된 것 같다. 흔적의 나열이나 재배치보다는 보다 더 끈끈한 구성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몸 이라는 덩어리를 내 작업의 틀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몸이라는 공간 안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몸이 시간과 경 험의 물리적 축적물이라는 사실이 모두 그림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 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몸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담론이나 정체성 정치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맞지만은 않은 리딩 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작품에서는 유기적 구성체를 만들고 싶었고 그것의 구체적이고도 추상적인 공간을 몸이라는 공간에서 찾아 상상한 것이다. 인터뷰 사전 미팅 이후 작품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의 의미를 조금 더 엄밀히 하고 싶 어서 몸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지 생각해봤다. ‘네트워크’라는 말이 더 맞을까 싶다가도 그 말이 내게는 너무 관 념적이었다. 촉각적으로 상상되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네트워크는 둥둥 떠다니는 말 같았다.
임: 네트워크도 몸과 마찬가지로 오해가 많은 말인 것 같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백 작가가 좋아하는 다른 회화 작가 들의 작품을 여럿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이 풍경화였다. 또 그림의 구성을 지칭할 때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 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구체적인 공간 또는 촉각적인 공간을 상상하기 위해서 몸을 떠올렸다는 답변을 생각해보면 전시 서문에서 사용하는 “몸(공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간(몸)”의 표현이 순서나 수위 면에서 더 적당한 것이 아닐까? 민백 작가의 “몸”은 공간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러니까 회 화라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잘려진 독립적인 가상공간이라고 이해된다.
민: 맞다. 몸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보편적으로 느껴져서 선택했다. 내가 말하는 추상 공간을 상상하기 위해서 나 한테 가까운 것, 내가 갖고있는 것으로 생각해본 결과다. 회화라는 공간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작업으로 하는 것이 근육과 혈액으로 가장 바깥의 피부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임: 또 몸은 “the body (of)”라는 영어표현으로 쓰일 때 큰 단위의 묶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적으로는 미술 글쓰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떠올랐다. 어떤 공통분모를 가진 시리즈물, 전작(oeuvre) 및 작업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개별 요소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자유도가 있으면서도 종국에는 하나의 단위에 속박되는 구성체(construct)나 모순되고 대조되는 여러 요소가 혼재한 복합체(complex)라고 ‘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 “the body of works”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내 작업 과정이 떠올랐다. 작업을 할 때 보통 두세 개의 작업을 동 시에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그 그림들 안에 나름의 관계가 구축된다. 각 그림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두세 개의 작업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관계가 작품을 설치할 때 어떤 작업이 제법 잘 어울리는 지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게 재밌기도 하고 이 전시가 다양한 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집단이라 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다.
2
임: 민백 작가가 이전에 쓴 글에서 평면에 공간을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도와 회화가 닮았다고 한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다. 그리고 민백 작가의 작업실 한 귀퉁이에 붙어있던 레퍼런스 이미지가 생각났다. 지도, 내부가 부 분적으로 보이는 광물, 현미경으로 본 세포와 곰팡이 등의 사진이 붙어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미지를 ‘과학 이 미지’라고 묶어서 생각해보았다. 최근에 읽은 어떤 글에서 이론과학(theoretical science)과 순수미술의 차이에 대 해 언급하는 부분이 떠올랐는데, 두 영역에서 생산하는 이미지를 두고 과학 이미지는 가능한 한 투명한 이미지를 생산하길 원해왔고 반대로 미술 이미지는 물질성과 모호함,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실을 재생산하는 것에 무능하기 를 테마로 채택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각 영역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2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서 민백 작가가 작업을 위해 과학 이미지를 참고하는 방식과 투명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연상 되었다. 민백 작가는 과학 이미지와 미술 이미지 사이의 차이보다는 닮은 점에 주목하는 것 같다. 공간 혹은 정보를 평면으로 납작하게 만들고 그 안의 법칙을 만든다는 방법론의 유사성에 집중하는 것 같다.
민: 학부 때 한 교수가 내가 만드는 그림을 보고 이거 몸인 것 같다고, 드립(drip)을 보고는 혈류처럼 보인다고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알 것 같다. 나는 내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작품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근육과 혈액으로 외피를 만들 수 있을까 질문하는데 그게 엑 스레이 사진이나 수술 영상과 같은 ‘과학 이미지’를 보았을 때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다. 사회적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과학적 언어나 이미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의 공통점은 납작하다는 지점일 텐데 무언가를 평
면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을 표현하길 시도하지만, 오류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지도나 조감도를 예로 들면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도 오류가 많은 것처럼 말이 다. 어떤 평면이든 그런 것 같다. 이 선천적인 결함을 수용하고 이건 환상이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만 무언가가 가능한 것 같다.
민백 작가 인터뷰
질문: 임서진(미술비평) / 답변: 민백
1 - 라바 램프와 몸이라는 공간
2 - 제도 무렵의 미술, 재현, 그리고 환상
3 - 추상의 방언을 변주하기
라바 램프와 몸이라는 공간
임서진(이하 임): ‘라바 램프’와 ‘몸’이 전시의 키워드로 소개된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회화적 표현, 라바 램프, 그리 고 몸에 대한 생각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었는지 궁금하다.
민백(이하 민): 그림이 먼저 있었고, 그 그림을 “Lava Lamp 01”이라고 제목 지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몸’과 연 결 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바 램프라는 오브제는 오래전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라바와 램프의 조 합이 너무 이상했다. 시각적으로 유혹적이고 색이 강렬한 오브제 같았고 라바 램프의 공간이 내가 만들고 싶어 하 는 공간의 느낌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 이후 비슷한 태도로 그린 것들을 모두
“Lava Lamp”라고 제목 지었다. 여기서 비슷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종착점에 대한 가정이 없었던 것, 시간을 두고 가볍게(투명하게) 중첩하고자 한 구성, 그리고 이질적 성격의 파편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라는 조건들을 의미한 다. 지금 언급한 몇 개의 구심점을 제외하고는 아무 제약 없이 그리는 게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의 목표였다. 사실 추상 작업은 제목을 짓기가 어렵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제목에서 너무 많은 단서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목이 지나치게 설명적이어도 안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토대를 가리키는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이 정보 자 체가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라바 램프가 작품에 대해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였다. 이번 전시 가 라바 램프 연작으로 구성되었지만 하나의 통일된 미감이나 스타일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보다는 개별 적인 그림에 맞는 개별적인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다.
임: <Lava Lamp 01>(2019)에 적용된 태도가 그림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나?
민: <Lava Lamp 01>은 2019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쯤, 나의 언어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만든 작품 이다. 이번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작업이 많이 변했다. 이전에는 상징이나 기호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형상, 일종의 지시적 언어 같은 것들을 간단한 회화적 트위스트와 함께 그렸다. 예를 들어 엑스 모양 의 선을 그리고 그 선에 파란색 모양을 넣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미있는 트위스트들로 화면을 구성했다.
전시작들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그림 톤이 조금 더 미묘하고 납작했던 것 같고, 단색으로 칠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얻고 싶은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색깔 채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그저 수단이 되는 것 같았다. 그걸 더는 하고 싶지 않았고 과정 중에 내가 조금 더 깨어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는 내가 그린 그림보다는 그려진 그림, 스스로 자생하 는 혹은 자라나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었다. 그 방법을 고민했고 결과물을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과정을 더 포용해야겠다는 것이 처음 떠올린 방법이었다. 그리기에 수반되는 모든 결정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무시되지 1 않고, 착취되지 않는 방법을 고심했다. 마지막에는 그 과정들이 모두 잘 얽혀서 저절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그림
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Lava Lamp 01>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설정한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제한점보다는 중심점을 바꿨던 것 같은데 일단 형상을 그리지 않는 것과 그림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었다. 이전 작업에서 항상 도 형과 윤곽을 사용했고 주로 작은 스케일의 작업을 했었는데, 과정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기
1 “과정을 포용한다”라는 말에서 “포용(embrace)”은 그리기의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수행, 이용, 활용, 사용, 받아들임 등의 표현으로 대체했을 시 원래의 중의적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생각되어 본문에 서는 일괄적으로 “포용”을 사용하였다.
1
로 했다. 스케일의 경우 작은 스케일이 보는 사람을 집중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서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작업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스케일이 커졌을 때 내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계 속 벌어질 것이고 그걸 이용해보자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Lava Lamp 01>은 나의 움직임, 흔적, 얼룩 등의 요 소로 만들어졌다. 작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캔버스 위에 어떤 흔적이나 색을 캔버스에 올린다. 이 첫 단계의 표 시가 가진 고유한 느낌이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느낌의 표현을 옆에 넣는다. 예를 들어 조금 눌린 모양이 첫 단계 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옆에는 튀어나오는 걸 그려 넣는다. 호환되는 것 혹은 반대되는 것을 병치하고, 이질적인 그 것들을 한번 묶어주고, 또다시 그것들을 흐트러트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한다. 그렇게 과정 중에 내 주관에 따른 시각적 상호작용, 반작용, 연쇄작용이 있었다.
임: “몸(공간)”이라는 용어에 대한 민백 작가의 정의가 궁금하다.
민: 다양한 것들이 혼재하면서 자생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이라는 이 가상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촉각적 형태를 상상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게 물질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간을 떠올려야 했고, 촉각적 형태로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내게는 몸이라는 공간이었다. 나와는 독립된 별개의 오브제 인 라바 램프에서 내가 가진 몸으로 생각을 옮겨왔다. 어떻게 보면 몸은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 작한 전환점이 된 것 같다. 흔적의 나열이나 재배치보다는 보다 더 끈끈한 구성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몸 이라는 덩어리를 내 작업의 틀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몸이라는 공간 안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몸이 시간과 경 험의 물리적 축적물이라는 사실이 모두 그림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 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몸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담론이나 정체성 정치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맞지만은 않은 리딩 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작품에서는 유기적 구성체를 만들고 싶었고 그것의 구체적이고도 추상적인 공간을 몸이라는 공간에서 찾아 상상한 것이다. 인터뷰 사전 미팅 이후 작품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의 의미를 조금 더 엄밀히 하고 싶 어서 몸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지 생각해봤다. ‘네트워크’라는 말이 더 맞을까 싶다가도 그 말이 내게는 너무 관 념적이었다. 촉각적으로 상상되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네트워크는 둥둥 떠다니는 말 같았다.
임: 네트워크도 몸과 마찬가지로 오해가 많은 말인 것 같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백 작가가 좋아하는 다른 회화 작가 들의 작품을 여럿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이 풍경화였다. 또 그림의 구성을 지칭할 때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 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구체적인 공간 또는 촉각적인 공간을 상상하기 위해서 몸을 떠올렸다는 답변을 생각해보면 전시 서문에서 사용하는 “몸(공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간(몸)”의 표현이 순서나 수위 면에서 더 적당한 것이 아닐까? 민백 작가의 “몸”은 공간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러니까 회 화라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잘려진 독립적인 가상공간이라고 이해된다.
민: 맞다. 몸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보편적으로 느껴져서 선택했다. 내가 말하는 추상 공간을 상상하기 위해서 나 한테 가까운 것, 내가 갖고있는 것으로 생각해본 결과다. 회화라는 공간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작업으로 하는 것이 근육과 혈액으로 가장 바깥의 피부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임: 또 몸은 “the body (of)”라는 영어표현으로 쓰일 때 큰 단위의 묶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적으로는 미술 글쓰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떠올랐다. 어떤 공통분모를 가진 시리즈물, 전작(oeuvre) 및 작업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개별 요소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자유도가 있으면서도 종국에는 하나의 단위에 속박되는 구성체(construct)나 모순되고 대조되는 여러 요소가 혼재한 복합체(complex)라고 ‘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 “the body of works”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내 작업 과정이 떠올랐다. 작업을 할 때 보통 두세 개의 작업을 동 시에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그 그림들 안에 나름의 관계가 구축된다. 각 그림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두세 개의 작업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관계가 작품을 설치할 때 어떤 작업이 제법 잘 어울리는 지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게 재밌기도 하고 이 전시가 다양한 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집단이라 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다.
2
임: 민백 작가가 이전에 쓴 글에서 평면에 공간을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도와 회화가 닮았다고 한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다. 그리고 민백 작가의 작업실 한 귀퉁이에 붙어있던 레퍼런스 이미지가 생각났다. 지도, 내부가 부 분적으로 보이는 광물, 현미경으로 본 세포와 곰팡이 등의 사진이 붙어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미지를 ‘과학 이 미지’라고 묶어서 생각해보았다. 최근에 읽은 어떤 글에서 이론과학(theoretical science)과 순수미술의 차이에 대 해 언급하는 부분이 떠올랐는데, 두 영역에서 생산하는 이미지를 두고 과학 이미지는 가능한 한 투명한 이미지를 생산하길 원해왔고 반대로 미술 이미지는 물질성과 모호함,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실을 재생산하는 것에 무능하기 를 테마로 채택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각 영역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2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서 민백 작가가 작업을 위해 과학 이미지를 참고하는 방식과 투명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연상 되었다. 민백 작가는 과학 이미지와 미술 이미지 사이의 차이보다는 닮은 점에 주목하는 것 같다. 공간 혹은 정보를 평면으로 납작하게 만들고 그 안의 법칙을 만든다는 방법론의 유사성에 집중하는 것 같다.
민: 학부 때 한 교수가 내가 만드는 그림을 보고 이거 몸인 것 같다고, 드립(drip)을 보고는 혈류처럼 보인다고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알 것 같다. 나는 내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작품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근육과 혈액으로 외피를 만들 수 있을까 질문하는데 그게 엑 스레이 사진이나 수술 영상과 같은 ‘과학 이미지’를 보았을 때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다. 사회적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과학적 언어나 이미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의 공통점은 납작하다는 지점일 텐데 무언가를 평
면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을 표현하길 시도하지만, 오류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지도나 조감도를 예로 들면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도 오류가 많은 것처럼 말이 다. 어떤 평면이든 그런 것 같다. 이 선천적인 결함을 수용하고 이건 환상이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만 무언가가 가능한 것 같다.
제도 무렵의 미술, 재현, 그리고 환상
임: 유학을 가는 경험이 대개는 하나의 덩어리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민백 작가는 유목적으로 여러 도시를 오간 것 같다. 여러 이주 경험이 작업에 관련한 관심사나 스타일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고 회화를 주 매 체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예술중학교에 가게 되었다. 입시 미술을 재밌게 하기도 했다. 입시 미술이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 제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점수를 주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했다. 중학교를 마치고 또 입시를 치르고 예술고등학교에 갔다. 입시 미술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 이 있어서 미국의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대학을 시카고로, 또 미술대학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도시가 음울하다고 느껴졌고 일학년 과정에서는 페인팅 이외의 작업을 많이 해야만 했다. 입학 후 첫 학기에 패기 넘치게 페인팅 수업도 들었지만 작업을 정교한 말로 설명하고 회화의 긴 역사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중압감을 느꼈다. 페인팅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후 일 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때 예술과 기술, 퍼포먼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학년이 되어서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 페인팅 수업을 들었다. 그때의 교수는 역사나 이론을 한 톨도 넣지 않고 작품이 조형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집중해서 수업을 운영했다. 그게 나한테는 어떤 해방감을 줬다. 이럴 수 있구나,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후 쭉 그림을 그 리고 있다. 나한테 유학 생활은 보스턴, 시카고, 지금은 필라델피아로 나뉘는 나름의 시기들이 있는 것 같다. 그중에 서 내게 큰 영향을 끼친 건 시카고다. 학교에서의 영향과 더불어 시카고는 회화 커뮤니티가 강한 곳이었다. 그곳에 서 지낸 기간 동안 회화 전시가 많았고, 내가 다닌 학교에서도 회화과의 규모가 가장 컸다.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의 상설전시를 통해 회화를 볼 기회도 많았고 당시 내게 제일 큰 자원이 되었다.
Boris Groys, “Art in the Age of Biopolitics,” Art Power,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p. 55. 2 3
임: 의식적으로 페인팅을 해야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안착하게 된 과정처럼 느껴진다. 사실 학교나 도시 의 분위기가 학생의 선택과 관점에 당연하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내 경험으로는 개념미술에 조금 더 주목 하는 커리큘럼 안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던 것 같다. 그래서 회화는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살펴보지 않는 한 자연 스럽게 보거나 찾게 되는 장르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공부 과정에서 회화 매체의 재
현을 극복 돌파한 “개념적 전환”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회화를 봐왔기 때문에 회화가 상대적인 대상이 되었고 또 회 화 매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부족해졌던 것 같다.
민: 제도라는 주제는 항상 어려운 것 같다.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를 정말 좋아하는데 시카고에 아웃사이 더 아트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 시카고에 관련 미술관이 두 개 정도 있는데, 가서 보면 이걸 어떻게 3 교육도 없이 그렸고, 어떻게 발굴되었고,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 동시대에서 아웃사이더 아트를 한다면 내 가 봐왔던 헨리 다거(Henry Darger), 빌 테일러(Bill Taylor), 조셉 요아쿰(Joseph Yoakum)의 작품만큼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 크다. 아웃사이더 아트도 제도권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아웃사이더라고 규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아트 작업이 제도권 미술 가의 작업과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 휘트니 비엔날레에 전시된 샤라 휴 즈(Shara Hughes)의 작업을 보면 이상한 공간의 풍경을 그리는데 그런 작업이 아웃사이더 아트의 이미지와 비슷 하다고 생각했다. 한쪽은 독학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제도권 교육을 받았고 작품이 순수미술-화 되었다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다.
임: 언급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환상적인 구상 경향의 작업이 많았다. 이게 어떻게 본인의 추상 작업으로 번역되 었을지 궁금하다.
민: 이상하게도 구상 작업을 더 많이 본다. 추상 회화를 볼 때는 공부할 수 있는걸 찾는 느낌이다. 여기서 내가 뭘 배 우고 뭘 참고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본다. 나와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한다면 반갑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집중해서 보 게 된다. 최근에 찾아보는 작업은 크리스토퍼 쿤(Christopher Kuhn)의 작업인데, 이 사람도 큰 마크 메이킹(mark making)을 한 다음 나름의 논리와 직관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 같다. 회화 작업의 과정을 포용한다는 점이 내 작업
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서 종종 찾아보는데, 이런 작업은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참고하기 위해 보게 된다. 오히려 추 상적인 구상을 볼 때 온전히 즐기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구상은 추상에 가까울수록 힘이 있는 것 같고, 추상은 굉 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힘이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재현(representation)과 환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재현적”인 작업을 했 다고 평가받는 회화 작가들도 사실은 현실과 똑같이 그려야한다는 생각은 없었을 것 같다. 빛의 효과를 비슷하게 표현한다거나 덜 작위적인 구도를 상상하는 장치는 있었겠지만 그건 관객이 환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 지, 오로지 재현을 위한 장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림이 이미 환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온전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회화의 선천적인 결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야지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한다고 언급한 회화 작가들이 주로 환상적인 주제나 표현에 천착한 작업을 하는데 애초에 재현보다 그림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들일 것이다. 나도 재현이나 표상에 관심 이 없는데 그 대신 그림을 위한 구체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구심점, 태도, 공간 등을 스스로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상의 방언을 변주하기
임: 민백 작가의 작업에서 그림의 색이 밑에 있는 건지 위에 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Lava Lamp 05>(2021)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는 소박한 미감을 가진 작업 또는 제도권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의 작업을 지칭한다. 3 4
민: 그런 효과를 좋아한다. 작품에 쓰는 색깔이 많은데 그것들을 흑백으로 치환한다고 자주 생각해본다. 그 여러 색 이 모두 비슷한 그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눈은 색이 앞의 레이어(layer)에 있는지 뒤의 레이어에 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비슷한 회색이 된다고 해도 절대 똑같은 지점에 머무를 수 없다 는 걸 알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공간을 설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요즘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형광색을 가장 아래의 레 이어에 배치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상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형광은 튀어나오는 색인데, 질감 자체는 제일 뒤에 있 어 납작해진다. 페인팅과 드로잉으로 많이 만들어보는 것 중에는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다른 물감을 흘려 그 이전 형상의 기능을 무시하는 구조나 형상의 얼룩을 따라가거나 채워주거나 더욱 강조해주는 효과들을 사용하면 서 이미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는 효과를 실험해보고 있다. 얼룩이 있으면 똑같이 옮겨 그리지 않지만, 그 얼룩 옆에 같은 모양을 확대하거나 작게 덧붙여 에코(echo) 하도록 한다.
임: 작업에 사용할 색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계 열인 난색을 사용했다.
민: 색의 역사와 물리적 성격들을 많이 고려한다. 색의 역사는 그냥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아는 게 재밌기도 하고 색의 물리적 성격에 있어서는 써본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을 내 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듯이 축적한다. 색의 세부구성이나 착색력 등의 조건들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기억해둔다. 지금은 난색을 쓰는 게 재미있다. 내가 사용하는 색 자체가 예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왜 그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지의 지점이 재 밌다. 반대로 색이 너무 구리다 하면 왜 구리다고 생각하지? 뭐가 구린 걸까? 구리다고 느끼는 게 흥미로운데 이걸 어떻게 더 써볼까 생각한다. 지난번 우리 대화에서 그림이 “페미닌”하다고 코멘트해준 것도 재밌었다. 그것도 색에 서 나오는 것 같다.
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미술 작품을 볼 때 종종 정치적 올바름에 위배되는 느낌을 떠올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민: 맞다. 작품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느낌을 가지고 노는 것인데 느낌이란 실은 원시적이라고 생각한다. 예 를 들어서 추상에는 언제나 재현이라는 걸림돌 같은 대상이 있다. 추상 회화에 따라오는 여러 질문이 있다. 재현이 아니면 표현인가, 표현이면 어떤 당위가 있는가, 이 그림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등의 질문이 따라온다. 그런데 사 실은 논리를 떠나서 원시적으로 모두에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느낌이 정치적으로 올 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시지각을 건드리는 것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이 전시 이전의 작업들이었다. 회화적 트위스트를 넣음으로써 ‘이게 너가 느끼는 게 맞아?’하고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 지는 것이 옛 작업들이었다면 거기서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향을 조금 튼 것이 지금의 작업들이다.
임: “시선 둘 곳을 모르겠다”고 느끼게 되는 지점이 현재 작업의 완성 기준이라고 했다. 그걸 염두에 두고 2016~2018년도의 작업을 보았을 때, 당시의 작업은 몇 가지 형상이나 상징을 통해 시선 둘 곳을 명확하게 지시해 주는 느낌이다. 이후 그림에서 형상이 사라지면서 그게 점점 옅어진 것 같다.
민: “지시”라는 단어가 재밌다. 지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데도 시선을 두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 같다. 일단 이전 작업에서 사용하던 형상을 사용하지 않고 스케일을 일부러 키우면 작품을 보는 시야가 막히게 된다. 작 품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시선이 파편들을 보며 이동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재현, 표상, 서사 같은 것 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들 없이 내가 관객에게 바라는 건 결국 표면에 감각이 집중되어 경험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게 내가 성공시키고 싶은 마술 트릭이다. 그래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시선 둘 데 없게 만드 는 구조가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화면 위의 변화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라바 램프 의 운동성이나 몸이라는 공간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 대학원 수업 중에 “비주류 추상” 수업이 있다고 했다. 주로 비서구 미술에서 나타난 추상 경향을 수업에서 다뤘 다고 했는데 “비주류 추상”이라는 이름과 그 내용에서 추상 회화가 별도의 세계처럼 돌부터 건물까지의 단위가 모
5
두 다시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추상회화의 스펙트럼, 더 넓게는 회화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민백 작가 본인이 인지하는 추상회화의 스펙트럼 혹은 지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
민: 추상이 주는 느낌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은 원시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고대에 손바닥을 찍어놓은 벽화부터 시작해서 상징적인 문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원시적 언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러다가 여러 사조와 맞물리게 되고 재현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서양 추상미술사일 것이다. 내 가 생각하는 추상회화의 지형도는 굉장히 범민주적이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비슷한 느 낌이 추상과 같다고 생각한다.
임: 그러니까 추상회화의 스펙트럼이랄 것이 어떤 구분이 있거나 이질적인 것들이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원시적인 느낌 또는 감각으로 평등한 지형처럼 느껴진다는 말인가?
민: 맞다. 사실 내가 제일 많이 배우고 내재화한 것이 서구 시선의 미술사이고 보는 사람도 내 그림에서 당연하게 연상되는 것이 그런 미술사인걸 알고 있다. 그러한 해석이 의미 없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 다. 그런 식의 독해가 나 자신에게는 내가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의 울타리를 일부러 작게 만드는 일 같다.
임: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 “추상표현주의자들의 방언(vernacular of abstract expressionists)”을 참조한다는 문장이 있었다. 추상회화 작가로서 민백 작가가 추상표현주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차용하고 비판하 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관객이 작품을 읽을 때 느낄 감각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공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민: 맞다. 적극적인 차용이 아니다. 만약 내가 추상표현주의에 대해 발언하고 싶었다면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헬렌 프랑켄텔러(Helen Frankenthaler)의 이미지와 함께 배치하는 식의 작업을 했을 것 같 다. 일종의 선례처럼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미리 해둔 연구들이 있고 나는 그걸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다. 예를 들어 프랑켄텔러의 작품이 부드럽고 여성적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게 왜 그 느낌을 주는지 질문해보고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면 작품에 사용해보는 방식이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초반에 그렸던 그림들이 확실히 추상표현주 의의 계승처럼 보이는 것 같다. <Lava Lamp 04>(2020, 전시 미포함)가 그런 작업이고, 그 후에 <Mars Lamp>(2020)를 그렸다. 이후 재료에 대한 이해가 더 생겼다. <Lava Lamp 05>(2021)와 <Lava Lamp 06>(2021) 작업을 하면서는 재료와 현상들이 더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하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 작업들을 하면서는 원치 않게 물감의 밀도가 높아졌지만, 과도기에 필요한 그림들이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내 가 원하던 것에 가까운 투명함과 자발성의 표현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개인전 이후에 이런 방향을 더 탐구해볼 생 각이다.